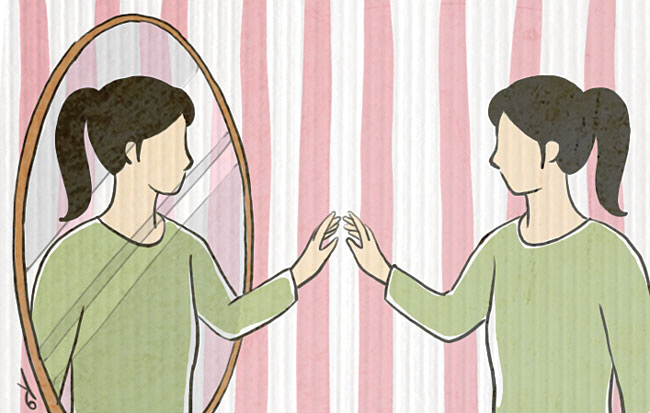
거울과 거울 - 양안다
왼쪽 거울에 내가 보인다.
오른쪽 거울에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보인다.
(양안다 시집 ‘몽상과 거울’)
나와 나, 우리
요 며칠 시무룩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다. 나이 좀 먹었다고, 어릴 때와는 다르다고 방심했던 탓이다. 상자 안에는 나에 대한 온갖 평가와 정의가 담겨 있었다. 나와는 무관한 성질의 것이라 확신하던 정의들이 마음 이곳저곳에 엉겨 붙었다.
“몰랐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 몰랐다. 내가 그렇단 말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항의 섞인 변명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급기야, “너는 너를 잘 모르는구나”라는 말도 듣고 말았다. 부정하면서도 그럴수록 나에 대한 타인의 정의를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처럼 불편한 채로 종일 끌고 다녔다. 어딜 가나 내가 들은 나에 대한 평가가 떠올랐다. 혼란스럽고, 싫고. 급기야 우울해지고 말았다. 친구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성장이라는, 어떤 책의 한 문장을 인용해주기까지 했다.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쯤은 나도 알고 있다. 뾰족한 마음만 들었을 뿐이다.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매번 나와 다투지 않나. 나를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야단치고 야멸차게 굴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우울한 마음만은 조금 가신 듯도 했다.
평생 해소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나’와 타인이 아는 ‘나’ 크고 작게 어긋난 채 서로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거울을 보듯. 서로 다른 ‘나’가 근사한 ‘나’였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거울을 본다. 이리 보면 못났고, 저리 보면 괜찮은 내가 거기 있다. 그래. 나는 ‘우리’지. 때에 따라 바꿔가면서 잘 살자. 고개를 끄덕여보았다. [유희경 시인·서점지기]
'2-4 김수호-문화새나시 > 유희경♣시 : 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희경의 시:선] 연하장 쓰는 일 [문화/ 2023-12-27] (0) | 2023.12.29 |
|---|---|
| [유희경의 시:선] 마주하기 [문화/ 2023-12-13] (0) | 2023.12.13 |
| [유희경의 시:선] 마음대로 [문화/ 2023-11-29] (0) | 2023.11.30 |
| [유희경의 시:선] 샤워를 하다가 [문화/ 2023-11-22] (0) | 2023.11.22 |
| 일에게로 돌아오기[유희경의 시:선] 일에게로 돌아오기 [문화/ 2023-11-15] (0) | 2023.11.20 |